청량한 시선
보행 약자 1천만 명 시대
어르신들과 함께 걷는 법
어르신들의 길 건너기를 지켜보면,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보행 신호등의 숫자는 바삐 줄어드는데, 어르신과 맞은편 도보 사이의 거리는 더디 줄어 결국 어르신들이 차도 위에 갇히는 일이 잦아서다. 그러다 클락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의 얼굴에 패인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다. 대체 왜 이런 서글픈 풍경이 어르신들께는 일상이 된 걸까.
writing. 박한슬 약사·메디컬라이터
노인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는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다. 단순한 착각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람의 뇌는 나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인식한다. 세 살 아이에게는 1년이 본인 인생의 1/3이나 차지하는 긴 시간이겠지만, 여든 살 노인에게는 1년이 본인 인생의 1/80이라 아이에 비하면 상대적 찰나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온 기간의 비율(proportion)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뇌 속의 시간 인식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닌, 정말로 노인에게 너무 가혹할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 시간도 있다. 바로 보행자용 신호등 시간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인 보행자용 신호등은 1초에 1m를 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4차선 도로의 경우, 폭이 15m 정도 되기 때문에 신호등은 15초 동안 켜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식이면 신호가 바뀌자마자 건너기 시작하는 사람만 길을 건널 수 있어, 보행 진입시간을 고려해 7초 정도의 추가 말미를 준다. 그러니 통상적인 4차선 도로의 경우, 신호등은 이동시간 15초에 진입시간을 위한 여유 7초를 더해 22초 정도 켜진다. 평범한 성인이라면 여유 있게 건널 시간이지만, 노인들에겐 이것도 짧단 게 문제다.
2018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평균적으로 1초에 0.7m 정도를 걸었다.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정한 1초에 1m보다 30%나 느린 셈이다. 그래도 15m짜리 횡단보도를 걷는다면, 가까스로 22초 즈음에 맞은편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긴 하다. 문제는 이 속도마저도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얻어진 ‘평균의 함정’에 가깝다는 점이다. 보행 속도가 느린 하위 10% 노인들은 1초에 0.4m 미만을 이동하는 게 고작이라, 보행 신호등의 22초를 모두 쓰더라도 중앙선을 겨우 넘긴 위험천만한 지점에 멈추게 된다. 지팡이를 짚고, 차도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는 노인들이 생기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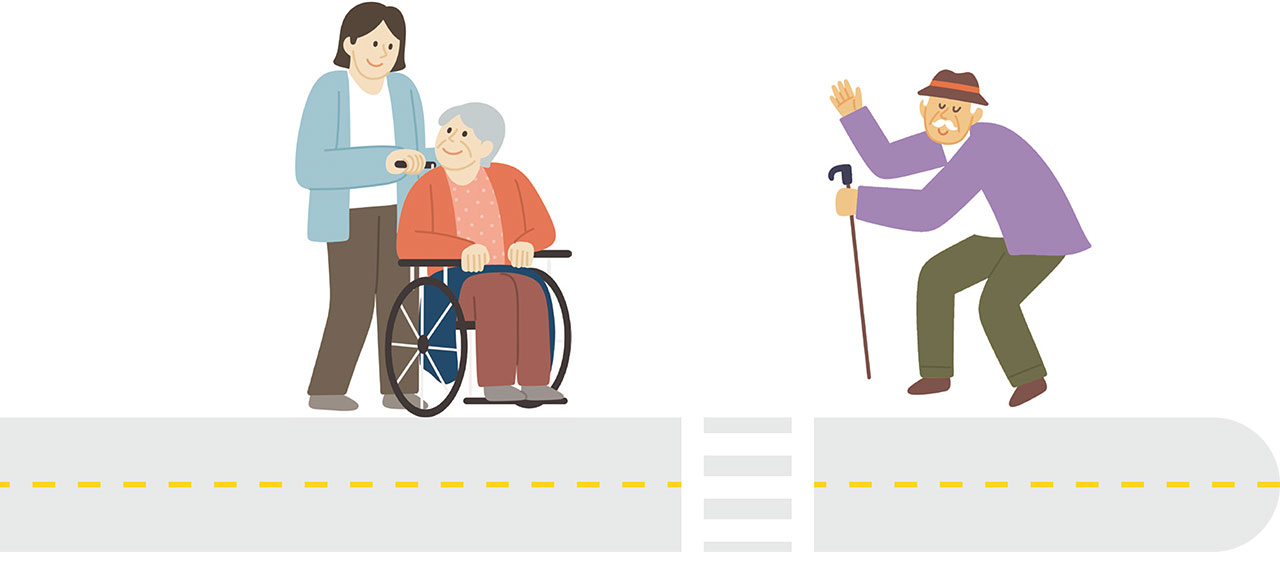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기술
고령화를 먼저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본이나 영국,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는 단순 횡단보도가 아닌, 보행자 감지 센서를 설치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운영되고 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신호등이 바뀌지 않게끔 조치하는 식이다. 물론 신호등만 바꿔 단다고 이런 장치가 기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행신호가 바뀌면 이와 맞물린 복합적인 교통 신호도 동시에 바뀌어야만 해서다. 교통망을 통제하는 국가에서 ‘교통약자’를 위해 이런 신호체계를 변동케 할 의지를 갖는 게 첫째고, 그럴 기술을 실용적으로 갖추는 건 그다음의 일이다. IT 강국에서 이런 기술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짐작하는 대로다.
실제로 노인들이 겪는 불편은 알지만, 그렇다고 교통을 마비시킬 순 없다는 반응도 적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는 꼭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걸음 속도가 느린 어린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교통약자 보호 기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스마트 횡단보도 기술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교통약자가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1초에 이동하는 거리를 0.8m로 낮춰, 보행 신호등 시간을 더 늘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려가 있음에도 국내에 다른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노인이 그리 많지 않아서였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께만 하더라도 11.3%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노인이 지방과 농촌 지역에 거주해 이들의 교통 불편이 사회적 의제로 주목받질 못했다.

함께 잘 걷는 사회를 위해
걸음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는 등 정상적 보행이 힘들어지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보행장애’라고 부른다. 젊은 나이에도 장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Sarcopenia)을 겪기 쉬워 보행장애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노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했다. 노년의 생활 기능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고, 이를 벌충해주는 복지 프로그램도 드물었다. 좁게는 교통 문제지만, 넓게는 이동권과 행복추구권과도 닿은 문제를 우리 사회가 너무 가벼이 여기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가 그렇게 노인이 됐고, 앞으로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을 특수한 일부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적잖은 수를 차지하는 ‘보통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은 지금도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다. 물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춰 사회의 많은 부분을 조정하면, 지금보다 다양한 ‘비효율’을 감내하긴 해야 할 테다. 그렇지만 조금 느려지면 어떤가. 이들도 함께 잘 걸을 수 있는 사회가 잘 갖춰진다면, 그 혜택은 현재의 노인만이 아닌 미래의 나와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통합이자, 세대 갈등의 봉합 방법이 아닐까. ‘걷기’는 시작일 뿐이다.

